귀옛말
2015.11.15 04:41
귀엣말
鄭 木 日
공원 벤치에 앉은 초등학교 1학년 쯤 되는 소녀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소곤거렸는지, 모녀가 개나리꽃처럼 웃고 있다.
귀엣말은 귀안에 따스한 입김이 스미며 마음속으로 젖어온다. 이 세상에서 둘 만이 간직하고 싶은 은밀한 소통이다. 가장 다정한 사람끼리의 눈짓이요 정다운 교감이다. 아무도 엿듣지 않게 둘만의 대화는 친밀함과 은근함을 나타낸다.
손나팔을 만들어 상대방 귀에 대고 마음의 소리를 내듯 살그머니 속살거린다. 새봄에 피어난 목련꽃, 매화처럼 향기로운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이다. 사랑과 평화의 표정을 지닌 음성이다.
목소리도 표정과 향기가 있다. 목소리는 마음의 울림이요, 향기여서 아무리 연기를 잘 하는 배우라 할지라도 속일 수가 없다. 맑고 평온한 마음이어야 행복과 사랑의 소리가 울려난다.
귀엣말은 소리의 눈 맞춤이다. 극장에서 연인끼리 귀엣말을 주고받는 광경이나,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귀에 대고 귀엣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금세 행복감을 느낀다. 입김을 불어 넣으며 참았던 말을 소곤거리는 쪽이나, 간지럼을 타며 온 신경을 기울여 듣는 쪽의 눈빛은 새벽별처럼 반짝인다. 어느 별과 눈 맞춤할 때처럼, 몇 만 광년 전에 떠났던 별빛이 내 동공 안에 들어와 빛나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도 귀엣말을 나누던 때가 있었다. 30대에 벽지 교사였던 우리 부부는 사글세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지내던 때가 있었다. 이때에 우리 부부는 곧잘 귀엣말을 주고 받았다. 방 안쪽부터 어머니, 아기, 아내가 차례대로 눕고 방문 쪽이 내 차지였다.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지내려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아기가 방글방글 웃으며 자라고 있었으므로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방 밖 추녀 밑에는 제비집이 있어서 어미 제비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 말을 배울 무렵에, 제비새끼도 “지지배배- ” 말을 배우고 있었다. 우리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 새끼 제비는 날개 짓을 해대며 하늘로 날아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곁에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와 아기가 함께 있었다. 학교일, 아기 키우는 일, 가정 일에 바쁜 아내의 일상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살그머니 다가가 아내의 귀에 손 대롱을 만들어 말하곤 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름을 불렀다. “왜요? 싱겁긴-” 그녀가 웃었다.
아이가 커면서 아내가 가끔씩 손나팔을 만들어 내 귀에 대고 귀엣말을 할 때면, 행복의 나팔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로 입김으로 심장박동으로 전해오는 말은 신비와 정감에 젖어 있었다. 귀엣말은 환희의 진동과 여운이 길었다.
나이가 들면서 귀엣말을 잊은 지가 오래다. 이제 손녀들이 커면 나에게도 귀엣말을 들려줄지 모른다. 손나팔을 만들지 본지 오래다. 누구의 귀에다 먼저 손나팔을 만들어 귀엣말을 소곤거려 보고 싶어진다.
아파트 앞 정원엔 동백꽃이 피어있다. 그 앞을 지나치면서 내 눈과 귀에 닿을 높이에 피어있는 꽃들과 인사를 나눈다. 꽃송이에 향기를 맡아보다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홀로 붉은 꽃을 피웠군요.”라며 귀엣말을 했다. 꽃은 필시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을 것이다.
가끔씩 나무를 껴안고 귀엣말을 해본다. 손 대롱을 만들어 나무에 대고 귀엣말을 들어본다. 가지를 타고 수액이 흐르는 소리, 햇빛을 받아들여 탄소동화작용을 하며 꿈의 궁전을 짓는 나무의 숨결을 듣는다. 바람과도 귀엣말을 주고받는다. 버들강아지에게 귀를 대고 봄의 귀엣말을 듣는다.
그 동안 왜 귀엣말을 잊고 있었을까. 마음의 소릴 듣는 귀를 상실하고 만 것일까. 왜 청각장애자로 살아온 것일까.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의 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가.
귀엣말은 둘 만의 은밀한 대화이며 공감이다. 욕심을 부리면 행복이 사라지듯이 귀엣말도 사라지고 만다. 귀엣말은 사랑의 입김이며 설렘이다. 순수의 말 꽃이요, 관심과 다정함의 손짓이다.
풀꽃과 바람과 바위와도 귀엣말을 나누었으면 한다. 하늘과 땅과 귀엣말을 나누고 싶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345 |
구성궁예천명 - 九成宮醴泉銘
[5] | 귀담 | 2016.01.22 | 5250 |
| 344 |
해서(楷書)
[11] | 귀담 | 2016.01.19 | 2390 |
| 343 |
개미 호박 보석
| 목향 | 2016.01.18 | 1208 |
| 342 |
김밥 한 줄
| 목향 | 2016.01.15 | 1164 |
| 341 |
필법십문(筆法十門 )에 대하여
[1] | 귀담 | 2016.01.12 | 1883 |
| 340 |
山査나무 외 1편
| 귀담 | 2016.01.09 | 1113 |
| 339 | 백수의 길 [5] | 귀담 | 2016.01.07 | 2425 |
| 338 |
겨울 산을 보며
[3] | 목향 | 2016.01.05 | 2402 |
| 337 |
젊은 그날
[3] | 귀담 | 2016.01.04 | 2123 |
| 336 | 안개의 집 [2] | 귀담 | 2016.01.03 | 1986 |
| 335 |
화분 깨진 꽃나무
| 귀담 | 2015.12.31 | 1143 |
| 334 |
호태왕비체
[1] | 귀담 | 2015.12.30 | 6034 |
| 333 | 서법강좌 -- 田英章(中國) | 귀담 | 2015.12.28 | 3186 |
| 332 |
활어
| 귀담 | 2015.12.28 | 1097 |
| 331 | 겨울숲 | 귀담 | 2015.12.24 | 1072 |
| 330 | 비오는 날 | 귀담 | 2015.12.24 | 1145 |
| 329 | 詩魔 | 귀담 | 2015.12.21 | 957 |
| 328 | 산책 (散策) [4] | 귀담 | 2015.12.20 | 2947 |
| 327 |
남강문학회
[2] | 전영숙(33) | 2015.12.20 | 14866 |
| 326 | 겨울밤 [2] | 귀담 | 2015.12.19 | 3015 |
| 325 |
추사의 歲寒圖
| 귀담 | 2015.12.17 | 1411 |
| 324 |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저녁 [2] | 귀담 | 2015.12.16 | 2537 |
| 323 | 갈대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1] | 귀담 | 2015.12.19 | 4801 |
| 322 | 낮 꿈== [3] | 귀담 | 2015.12.15 | 2528 |
| 321 |
四季에 흐르는 물소리
[2] | 귀담 | 2015.12.13 | 2352 |
| 320 | 손자손녀 이름 짓기 [8] | 귀담 | 2015.11.29 | 3611 |
| 319 | 문인의 길 [2] | 목향 | 2015.11.23 | 3271 |
| 318 | 12월의 편지 [1] | 목향 | 2015.11.20 | 3055 |
| 317 |
결혼폐백에 대하여
[3] | 귀담 | 2015.11.15 | 2905 |
| » |
귀옛말
[1] | 목향 | 2015.11.15 | 30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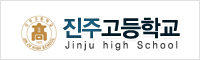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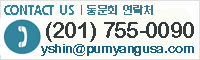
귀엣말 , 목향의 인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필이다.
보통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높은 음정으로 산다.
경상도 사람 셋 모이면 옹기동이가 깨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큰소리, 으싯대는 고음으로 폼을 잡는 사람을 본다.
그럴 때는 아~~ 잘났다. 너 잘났다! 속으로 핀잔을 준다.
언젠가 회사 출장으로 구라파 지역을 여행한적이 있다.
아침 식사하러 로비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데 소곤거리는 소리가
화음으로 들렸다. 이미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소곤소곤 저음의 소리가
마치 고향곡처럼 내 귀에 들렸다. 서양인들은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밥상에서 말하지 않도록 배웠다.
나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목청이 높다. 낮추어야한다.
손데롱을 만들어 마음의 귓속에 소곤거리는 氣를 주고 받아야 한다.
나의 목소리에 향기를 지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