墨法辨 - 추사 김정희
2016.02.23 04:43
서가書家들은 묵墨을 제일로 치는데, 대체로 글씨를 쓸 때에 붓털(毫)을 부리는 것은
곧 붓털로 하여금 묵을 묻히도록 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종이와 벼루는 모두 묵을 도와서 서로 쓰임을 발하는 것이니,
(좋은)종이가 아니면 묵을 받을 수 없고 (좋은)벼루가 아니면 묵을 발산시킬 수 없다.
묵의 발산된 것은 곧 묵화墨華의 떠오르는 채색이니,
일단一段의 묵을 잘 거두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묵을 거두는 데에만 능하고 묵을 발산시키는 데에
능하지 못한 것은 또 좋은 벼루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좋은) 벼루를 얻은 다음에야 글씨를 쓸 수 있으니,
(좋은) 벼루가 아니면 묵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종이가 묵에 대해서도 또한 벼루와 서로 비슷한 존재이니,
반드시 좋은 종이가 있어야만 이에 행묵行墨을 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묵과 징심당지澄心堂紙, 옥판지玉版紙와 동전桐箋, 宣箋 등의
종이를 보배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붓은 또 다음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직 붓 치레하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묵법墨法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시험삼아 종이 위의 글자를 보면 오직 묵 그대로일뿐이니
이는 백성들이 날로 쓰면서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중장韋仲將 또한 말하기를,
"장지張芝의 붓과 좌백左伯의 종이와 신臣의 묵을 써야 한다."하였고,
또 송宋나라 때에는 이정규李廷珪의 먹 반 자루를 천금같이 여겼었다.
그리고 고인古人의 법서진적法書眞蹟의 먹물 방울진 곳을 보면
마치 기장알(黍珠)이 불룩 튀어나와서 손끝에 걸릴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옛 묵법을 거슬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결古訣에 이르기를,
"먹물은 깊고 색은 진하며, 수많은 붓털이 힘을 가지런히 쓰게 한다.漿深色濃 萬毫齊力"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묵법墨法과 필법筆法을 아울러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 서가書家들은 '수 많은 붓털들이 힘을 가지런히 쓰게한다.
萬毫齊力'는 한 구절만 집어내어 이것을 묘체妙體로 삼고,
윗구절의 '먹물이 깊고 색이 진하게 한다.漿深色濃'는 말은 아울러 언급하지 않아서
이 두 구절이 서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니,
이는 꿈에도 묵법을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편고偏枯한 데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리고 망녕되이 논하기를
"고려 말기 이후로는 모두가 언필偃筆을 썼는데,
한 획의 상하 좌우로 붓끝이 스쳐간 곳과
붓 허리가 지나간 곳에 진하고濃, 묽고淡, 매끄럽고滑, 껄끄러운澁을 나누어 포치해서
획이 모두 편고하게 되었다." 고 한다.
그러나 진하고, 묽고, 맦럽고, 껄끄러움에 대해서는 묵법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 언필하고 안하고 하는 필법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묵법과 필법을 구별없이 혼동시키어 다만 필법만 들어서 논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편고된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국역 완당전집에서-
Comment 2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375 |
부채(합죽선) 이야기
[4] | 귀담 | 2013.06.16 | 6960 |
| 374 |
궁체정자 작품연습
[4] | 정일헌 | 2015.06.01 | 6902 |
| 373 |
청포도 -- 이육사 / 이명환
[8] | 귀담 | 2013.05.26 | 6879 |
| 372 | 민족의 대서사시 [6] | 전영숙(33) | 2015.03.29 | 6853 |
| 371 |
절차탁마 대기만성
[1] | 귀담 | 2014.02.16 | 6853 |
| 370 | 도정 권상호교수 한자철학#1 [1] | 귀담 | 2013.12.09 | 6829 |
| 369 |
소동파의 한식첩
[5] | 귀담 | 2014.05.26 | 6828 |
| 368 |
빗살무늬 토기 항아리
[2] | 목향 | 2015.05.08 | 6822 |
| 367 | 서예세상 : 도정 권상호 교수 [1] | 귀담 | 2013.12.09 | 6776 |
| 366 | 베로니카의 <그리운 금강산> / 방준재 [3] | 귀담 | 2013.06.09 | 6766 |
| 365 |
금문으로 쓴 한시
| 귀담 | 2013.02.12 | 6744 |
| 364 |
반딧불이
[2] | 귀담 | 2013.07.03 | 6708 |
| 363 |
도연명의 잡시 한 편 쓰다
[1] | 귀담 | 2014.02.02 | 6707 |
| 362 |
淸夜吟 청야음
[2] | 귀담 | 2013.09.29 | 6704 |
| 361 |
四字成語 --- 알묘조장 謁描助長이란.
[3] | 귀담 | 2013.08.21 | 6657 |
| 360 |
백두산트래킹 -- 이병소(33)
[3] | 귀담 | 2013.08.16 | 6649 |
| 359 | 한글 기초 --- 원필과 방필 | 귀담 | 2014.01.05 | 6643 |
| 358 | 한방에 끝내는 한자부수 [2] | 귀담 | 2014.01.12 | 6638 |
| 357 | 판본체 [ ㅅ ] 과 [ ㅇ ] 필법 [2] | 귀담 | 2014.01.05 | 6613 |
| 356 | 초서작품 [3] | 귀담 | 2014.05.11 | 6526 |
| 355 |
玄潭 曺首鉉 선생 서예 전각 전시회
[1] | 귀담 | 2013.06.01 | 6385 |
| 354 | 난초 향기 [4] | 목향 | 2014.03.13 | 6362 |
| 353 |
일신 또 일신 --日新 又 日新
[1] | 귀담 | 2013.10.25 | 6343 |
| 352 |
와! 이건....신이다
[1] | 전영숙(33) | 2013.08.03 | 6302 |
| 351 |
고구마 --- 전영숙 (33회)
[8] | 귀담 | 2013.10.01 | 6240 |
| 350 |
유상곡수(流觴曲水) 하던 신라 포석정
[1] | 귀담 | 2013.11.08 | 6220 |
| 349 | 대우주-- 외계 은하들 [5] | 귀담 | 2013.08.18 | 6202 |
| 348 |
세기의 대결 10번기
[2] | 귀담 | 2014.01.30 | 6201 |
| 347 | 진주유등축제와 서울유등축제 [3] | 목향 | 2013.08.13 | 6187 |
| 346 | 석재 서병오선생 추모전 관람 [3] | 귀담 | 2013.11.13 | 61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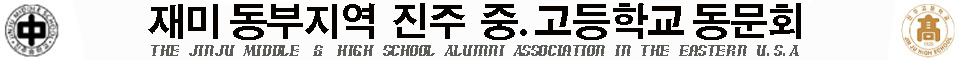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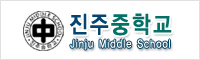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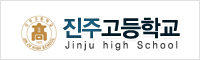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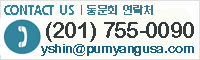
草書의 異副同形과 省略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