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窟)
2015.01.24 03:32
굴
정 목 일
굴은 어두침침하다. 햇살이 닿지 않고 은폐돼 있다. 단절과 폐쇄공간으로 존재한다. 자신을 숨기고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다.
굴은 소외와 밀폐된 공간만이 아니다. 인류의 첫 거처지이기도 하다. 원시인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던 천혜의 거주 공간이었다. 굴은 은신처가 되기도 했으며, 수도처와 예배처가 되기도 했다. 보물들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가 되기도 했다.
굴을 판다는 것은 깊이, 몰두에 대한 동경과 집념의 행위가 아닐까. 자신만의 자각 공간, 사색과 대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며, 영원 세계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을까.
2006년 10박11일의 실크로드 기행은 나에게 ‘굴’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둡고 음침한 굴은 나에게 깨달음의 공간으로 다가왔다. 나는 황하를 내려다보고 있는 병령사석굴(炳靈寺石窟)과 사막 속에 펼쳐진 돈황(敦惶)의 막고굴(莫高窟)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보았다. 폐쇄와 밀폐공간으로서의 굴이 아닌 깨달음의 길로써의 신성공간인 굴을 보았다.
세계 최대 불교미술의 유적지이자 보고(寶庫)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된 막고굴은 오랜 풍우에 빛이 바래고 마멸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굴속에 불상을 안치하고 흙담 위에 벽화를 그린 서기 366년부터 14세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남겨진 1천 여 개의 작품들 중, 현존하는 것은 4백여 개에 불과했다.
왜 굴을 파서 불상을 안치하는 형식을 택하였을까? 사막에서 불상을 제작하여 풍화작용에 훼손당하지 않고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색상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석굴이었다.
막고굴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다. 신앙과 예술을 위해 영혼과 의지를 불태운 숭고한 현장이었다. 몇 년에 걸쳐 하나씩의 굴을 판 다음 어떤 불상을 안치할 것인가, 또 어떤 내용의 벽화를 그릴 것인가를 구상하였다. 이 일은 일생의 구상이자 작업이기도 했다. 부처상을 안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일에 일생을 걸었다.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한 부처의 상을 인간이 과연 어떻게 조형해 낼 것인가. 그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했다. 부처상을 만들기 위해선 그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굴을 파면서부터 작가는 고뇌에 빠졌을 것이다. 마음속에 무상무념의 깨달음과 부처의 미소가 떠오를 때까지 면벽수도(面壁修道)를 해야 했다. 막고굴의 미술 제작자들은 명작을 남기고 싶은 개인적인 열망을 초월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 순정한 신앙심에 불타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자 했다. 마음을 비워서 하나의 굴이 되고자 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부처의 세상이고, 깨달음의 세계였다. 석굴 속에 들어가 신성 공간, 이상세계를 구현하려면 작가의 구원 의식과 깨달음, 창조적인 미의식과 상상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 기간이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들은 붓을 멈추고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에, 오래 동안 방황했던 길에서의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얻어 깨달음을 체득하고자 했다.
굴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안으로 햇빛이 비쳐들지 않아 청동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끌여 들여야 했다. 어둠 속에서 굴 안으로 조그맣게 반사된 빛을 따라 가면서 벽화를 그려갔다. 어둠의 공간 속에서 청동거울로 반사시킨 빛을 따라 섬세하게 그려가는 극사실화 작업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부분적으로 그려서 전체적인 구도에 맞게 해야 하므로 작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어려웠다.
아, 빛에 의해 그려지는 과정은 작가의 것 이전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뤄지는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아 그 속에서 마음을 그려가는 일이 벽화작업이었다. 빛에 따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그려갔다.
막고굴의 작품들은 어둠 속에서 안내자의 손전등으로 비춰주는 부분만을 볼 수 있다. 작가들은 어디로 가고 어둠만 남았는가. 석고굴의 미술작품들은 일일이 그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무명(無名)이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길 위에서 작품으로 한 채의 집을 짓고, 깨달음 속에서 떠나려 했다. 명예가 아닌 완성, 완성이 아닌 깨달음, 형체가 있으나 형체가 없는 성취를 바랐다. 그들은 이 일에 일생을 바쳤다.
막고굴 불교미술작품들은 마음과 깨달음으로 보아야 할 예술품이고, 사막의 실크로드 위에서 피운 구도와 영혼의 꽃이었다.
막고굴 안 어둠 속에서 나는 하나의 굴을 생각했다.
일생을 바칠 굴이다. 내 예배처가 되고 수도장이 될 굴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올 청동거울을 마련하고 싶다.
나도 굴 속 어둠에 묻혀서 내 일생을 깨달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수필가 목향 정목일
Comment 2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225 |
목월의 <나그네>와 지훈의 <완화삼>
[2] | 귀담 | 2015.03.24 | 4218 |
| 224 |
논개의 가락지
[5] | 목향 | 2015.03.23 | 3933 |
| 223 |
가람선생의 詩魔를 쓰다
[7] | 귀담 | 2015.03.21 | 5721 |
| 222 |
진주도립병원과 고향집
[10] | 목향 | 2015.03.14 | 4160 |
| 221 | 방준재의 <鄕愁 > [7] | 귀담 | 2015.03.08 | 3586 |
| 220 | 아름다운 구멍 [4] | 목향 | 2015.03.06 | 4003 |
| 219 |
鳶飛魚躍 연비어약
[5] | 귀담 | 2015.03.04 | 4594 |
| 218 |
보고 자파서 죽껏다 씨펄 !
[2] | 귀담 | 2015.02.28 | 3754 |
| 217 |
서산대사의 名詩
[14] | 귀담 | 2015.02.22 | 17959 |
| 216 | 나의 시계 [6] | 귀담 | 2015.02.15 | 3883 |
| 215 | 손의 표정 [5] | 목향 | 2015.02.07 | 4295 |
| 214 |
독서유감 (讀書有感)
[2] | 귀담 | 2015.02.04 | 4735 |
| 213 |
뉴욕의 함박눈
[5] | 귀담 | 2015.01.27 | 5861 |
| » |
굴(窟)
[2] | 목향 | 2015.01.24 | 3956 |
| 211 |
詩: 좌골신경통
[5] | 귀담 | 2015.01.21 | 5895 |
| 210 |
영화 <국제시장: Ode To My Father>
[5] | 귀담 | 2015.01.11 | 4941 |
| 209 | 우정은 커다란힘이 되어줍니다 | 전영숙(33) | 2015.01.09 | 1636 |
| 208 | 존재 [1] | 목향 | 2015.01.08 | 3867 |
| 207 |
Death Velly에 가고 싶다.
[5] | 귀담 | 2015.01.03 | 4993 |
| 206 |
새해 아침 우주관광
[5] | 귀담 | 2015.01.01 | 5536 |
| 205 |
童蒙先習 -- 붕우유신
[5] | 귀담 | 2015.01.01 | 4940 |
| 204 | 2015년 새해를 맞으며 [1] | 목향 | 2014.12.31 | 3719 |
| 203 |
겨울마을 사람들
[1] | 귀담 | 2014.12.31 | 4526 |
| 202 | 동문님 새해 건강하십시요 [2] | 전영숙(33) | 2014.12.31 | 4227 |
| 201 |
영혼 피리
[1] | 목향 | 2014.12.30 | 3478 |
| 200 |
함박눈
[2] | 목향 | 2014.12.29 | 4046 |
| 199 |
와이료
[4] | 전영숙(33) | 2014.12.29 | 16414 |
| 198 |
얼굴무늬수막새
[2] | 목향 | 2014.12.28 | 4095 |
| 197 |
[送詩] : 세월이여
[5] | 귀담 | 2014.12.24 | 4238 |
| 196 | 바람 [3] | 목향 | 2014.12.19 | 36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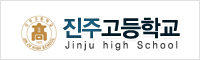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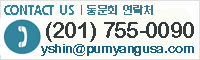

황하를 내려다 보고 있는 병령사석굴(炳靈寺石窟)과 사막 속에 펼쳐진
돈황(敦惶)의 막고굴(莫高窟)은 가 본 적 없지만 정말 대단한 불교 사적지 같다.
窟을 한자로 표기하여 破字하면 굴에도 창이있고, 출구가 있다.
우리 한민족도 굴 속에서 태어난 민족이다.
굴은 어둡고, 습기차고, 통풍이 않되는 밀폐된 공간이면서 또한
자신을 보호할 안전한 장소이기도하다.
옛날 우리 민족을 맥이(貊夷)라 부른 것도 굴 속에서 태어난 민족이란 뜻이다.
맥(貊)은 상고시대 굴속에 사는 우리 조상의 생명을 보호한 동물이다.
그 형상은 곰[熊]과 비슷하며, 쇠를 먹고 살았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짐승을 신수(神獸)로 숭상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 조상을 맥족(貊族)이라 불렀다.
맥이 사람과 함께 토굴 속에 있으면 토굴 안의 습기가 없어지며
나쁜 기운이 사람에게 침노하지 못했고, 사람이 밖에 나갈 때는
곁에 따라 다니며서 독충을 제거했고, 또 맥이 배가 고파 쇠를 찾아 먹기 위하여
돌을 깰 때 일어나는 불꽃을 보고 우리 조상들은 비로소 불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어냈으며 뒷날에는 이 불을 이용하여 쇠를 녹이고 단련하는 법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민족들은 어렸을 때 둔부에 검푸른 반점이 있으니,
이를 가르켜 삼신께서 아기를 태문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볼기를 때렸기 때문에
이러한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는 맥(貊)이라는 짐승을 숭상해 온
우리민족 특유의 표적이라고 한다.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토굴 속에 살면서 비바람을 피하고 맹수의 침입을
막았으나 가장 무서운 적은 대독(大毒)을 지닌 뱀과 전갈 등의 독충(毒蟲)들이었다.
이것들의 침입은 예고가 없으며 예방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크게 인간을 돕는 하늘의 뜻이 있어 사충(蛇蟲)을 청소하여 주는 신수(神獸)가 있었으니
이름하기를 [맥(貊)]이라 하였다.
실재로 이러한 믿기 어려운 신화가 우리민족 상고사와 중국의 본초강목 등등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과연 <맥이란 어떤 짐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