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2014.12.19 17:32
바람
정 목 일
항상 자유다.
상하 좌우 어떤 속박이나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시대, 역사, 전통, 윤리 그 어떤 제약 도 받지 않는다.
간섭받지 않는다.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한다.
형식이나 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누가, 무엇이 얽매이게 하려 하며, 무엇에로 종속시키려 든단 말인가.
모두 상관없는 일이다. 어떤 장벽도 상관없다.
자유로울 뿐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닐고 달리고 부르짖고 잠든다.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다.
죽은 것같이 딱딱한 나뭇가지에 움을 틔우는 것.
얼어붙었던 강물을 풀어 놓은 것이 누군가, 무엇이 폐쇄의 문을 잠그고 뒤로 돌아앉아 있는가.
어떤 문이든 어떤 어둠이든 그의 진로를 막아설 수 있는가.
생명을 가진 뭇생물들은 항시 그의 곁을 떠날 수 없다.
생명을 불어넣고, 숨쉬게 만든다.
황제이다.
형체도 부피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이 다스림.
보이지 않으나 가장 가까이 피부에 느껴지는 뚜렷한 실체.
조금의 틈과 굴헝과 여백도 남기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정복자이다.
어느 누구든 그의 손길 아래. 지배아래 들지 않으려 반역하는 자, 있을 수 있는가.
무한한 생각이다.
그 생각이 펼쳐내는 언어이다.
생각의 뿌리, 말의 근원이면서 생각 을 키우고 언어를 빚는 속삭임이다.
철따라 계절을 새로운 생각과 언어로 불어넣고 말을 키우게 한다.
누가 깃발의 상징과 의미에다 영혼을 불어넣어 펄럭이게 하는가.
구름, 또한 바람의 말을 받지 않고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으랴.
바람이 와서 아무도 모르게 내는 풍경소리처럼
사람에게도 생각의 파문을 일으키는 건 바람의 음성 때문이 아닌지 모른다.
꽃내음의 속삭임, 씨앗을 흩날리는 바람의 파종, 날리는 낙엽의 여운.
이런 것들이 바람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랴.
시인들의 많이 사용하는 시어중에 '바람'이 자리잡고 있다.
실은 바람은 한낱 시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그 자체를 탄생시키는 언어의 뿌리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보이지 않게 귀에 와 속삭인다.
왜, 보지 못하는가…….
얼어붙었던 개울물의 쇠사슬을 풀어놓고,
관목에게 움을 트게 하고, 꾀꼬리와 종달새를 불 러온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과거라는 낱말을 알지 못한다.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 이다.
늘 새로운 것이 아니고는 마음이 차지 않는다.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 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건 날려 버린다.
없애 버린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짜증이 나서 못 견딘다.
천의 얼굴, 만의 모습을 가졌다. 변화 무쌍하다. 종횡 무진이다. 신출 귀몰이다.
어디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다.
나비를 태워 가는 살랑바람, 꽃내를 실어보내는 바람의 미소는 연인의 체취처럼 감미롭다.
뇌성을 때리며 장대 같은 비를 휘몰고 돌진하는 폭풍우의 위용은 참으로 늠름하고 남자답다.
날려 버려라, 때려 없애 버려라.
아기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는 손길이다가, 꽃술에 입맞추는 연정이다가도,
금시에 바다를 뒤집어 버리는 야수의 허연 이빨로 변한다.
믿을 수 없다.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싱싱한 파도이다. 출렁이고 있다. 어디든지 가 닿고 있다.
대륙이나, 바다나, 산악이나, 하늘이나, 어디든지 통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이다. 어디로 갈까? 떠나야만 한다. 흘러가야만 한다.
머리가 무거우면 바람 쐬러 바깥으로 나간다.
바람 속에 서노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온유해진다.
모든 의식, 관념 같은 게 바람 앞에선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아닌가.
인생이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생각되어진다.
내 영혼은 언제나 떠돌이, 한 자락 바람이 되어 흐르며, 항상 바람 속에 떠돌고 있다.
Comment 3
-
귀담
2014.12.20 04:20
-
귀담
2014.12.21 05:51
어제 동문회 년말 송년 파티가 있었다.
모두들 노래방으로 옮겨 오랫만에 화끈한 시간을 가졌다.
김원집 대선배님 부부와 이춘리선배님 부부를 선두로
열창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특히 구경효부부의 이중창은 프로 수준의 노래 실력.
모두들 즐거운 하루밤 이였습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는 구정 파티에
우리 동문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새 회장단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
귀담
2014.12.25 08:21
바람! 나의 삶은 6할이 바람이였다.
바람 속에 태어나 바람 속에서 자랐다.
남도의 해풍을 맞으며 어린시절을 보냈고
남강의 모랫바람 속을 거닐며 시를 읊었고,
부산 해운데 산정에서 신혼을 보냈으며,
대구의 달성동 신작로를 3년간 헤메이었다.
그래도 바람은 그치지 않아
서울 용산의 한강 둑에서 가슴 가득한 엉어리를 풀었다.
바람은 더욱 거칠어져
잔인한 나의 바람은 태평양 건너
낯선 이국 땅으로 사정없이 내몰아쳤다.
바람이 거칠수록 나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메고
버팅기었다.
오늘도 나는
뉴욕 맨하탄 숨찬 거리를 칼바람 맞으며
노동의 쓴 맛에 입술이 탄다.
나의 삶은 정말로 정말로 6할 이상이 바람이었다.
오!~ 아직도 그치지 않는 나의 바람이여!

내 일흔의 쉼없는 바람 앞에
야윈 가슴을 열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는다.
내 일흔의 골목길에는 일흔의 바람꽃이 피고
내 일흔의 먼 바다 수평선에는 일흔의 태양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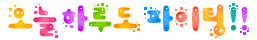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225 |
목월의 <나그네>와 지훈의 <완화삼>
[2] | 귀담 | 2015.03.24 | 4218 |
| 224 |
논개의 가락지
[5] | 목향 | 2015.03.23 | 3933 |
| 223 |
가람선생의 詩魔를 쓰다
[7] | 귀담 | 2015.03.21 | 5721 |
| 222 |
진주도립병원과 고향집
[10] | 목향 | 2015.03.14 | 4160 |
| 221 | 방준재의 <鄕愁 > [7] | 귀담 | 2015.03.08 | 3586 |
| 220 | 아름다운 구멍 [4] | 목향 | 2015.03.06 | 4003 |
| 219 |
鳶飛魚躍 연비어약
[5] | 귀담 | 2015.03.04 | 4594 |
| 218 |
보고 자파서 죽껏다 씨펄 !
[2] | 귀담 | 2015.02.28 | 3754 |
| 217 |
서산대사의 名詩
[14] | 귀담 | 2015.02.22 | 17959 |
| 216 | 나의 시계 [6] | 귀담 | 2015.02.15 | 3883 |
| 215 | 손의 표정 [5] | 목향 | 2015.02.07 | 4295 |
| 214 |
독서유감 (讀書有感)
[2] | 귀담 | 2015.02.04 | 4735 |
| 213 |
뉴욕의 함박눈
[5] | 귀담 | 2015.01.27 | 5861 |
| 212 |
굴(窟)
[2] | 목향 | 2015.01.24 | 3956 |
| 211 |
詩: 좌골신경통
[5] | 귀담 | 2015.01.21 | 5895 |
| 210 |
영화 <국제시장: Ode To My Father>
[5] | 귀담 | 2015.01.11 | 4941 |
| 209 | 우정은 커다란힘이 되어줍니다 | 전영숙(33) | 2015.01.09 | 1636 |
| 208 | 존재 [1] | 목향 | 2015.01.08 | 3867 |
| 207 |
Death Velly에 가고 싶다.
[5] | 귀담 | 2015.01.03 | 4993 |
| 206 |
새해 아침 우주관광
[5] | 귀담 | 2015.01.01 | 5536 |
| 205 |
童蒙先習 -- 붕우유신
[5] | 귀담 | 2015.01.01 | 4940 |
| 204 | 2015년 새해를 맞으며 [1] | 목향 | 2014.12.31 | 3719 |
| 203 |
겨울마을 사람들
[1] | 귀담 | 2014.12.31 | 4526 |
| 202 | 동문님 새해 건강하십시요 [2] | 전영숙(33) | 2014.12.31 | 4227 |
| 201 |
영혼 피리
[1] | 목향 | 2014.12.30 | 3478 |
| 200 |
함박눈
[2] | 목향 | 2014.12.29 | 4046 |
| 199 |
와이료
[4] | 전영숙(33) | 2014.12.29 | 16414 |
| 198 |
얼굴무늬수막새
[2] | 목향 | 2014.12.28 | 4095 |
| 197 |
[送詩] : 세월이여
[5] | 귀담 | 2014.12.24 | 4238 |
| » | 바람 [3] | 목향 | 2014.12.19 | 36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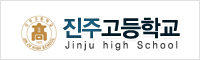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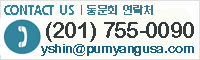
『반짝 반짝 빛나서 쳐다 보면
하늘의 별 동무
찰랑 찰랑 소리나서 귀 쫑긋 세우면
싱그런 바다가 깨어지는 소리.』
내 중학교 1학년 때 한글 시 백일장에서
장원한 【물결】이란 제목의 詩句다.
『나는 좋아라
나는 좋어라
파란 바다 꿈꾸는
가슴 팍 향해
눈부신 내 마음
자맥질 한다
이어서 이어서 사라지기 전에 』
목향의 『바람의 수필』을 읽으니
어릴 때 쓴 내 싯구가 절로 생각난다.
「바람」이나 「물결」이나
사람의 서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기 때문일까.